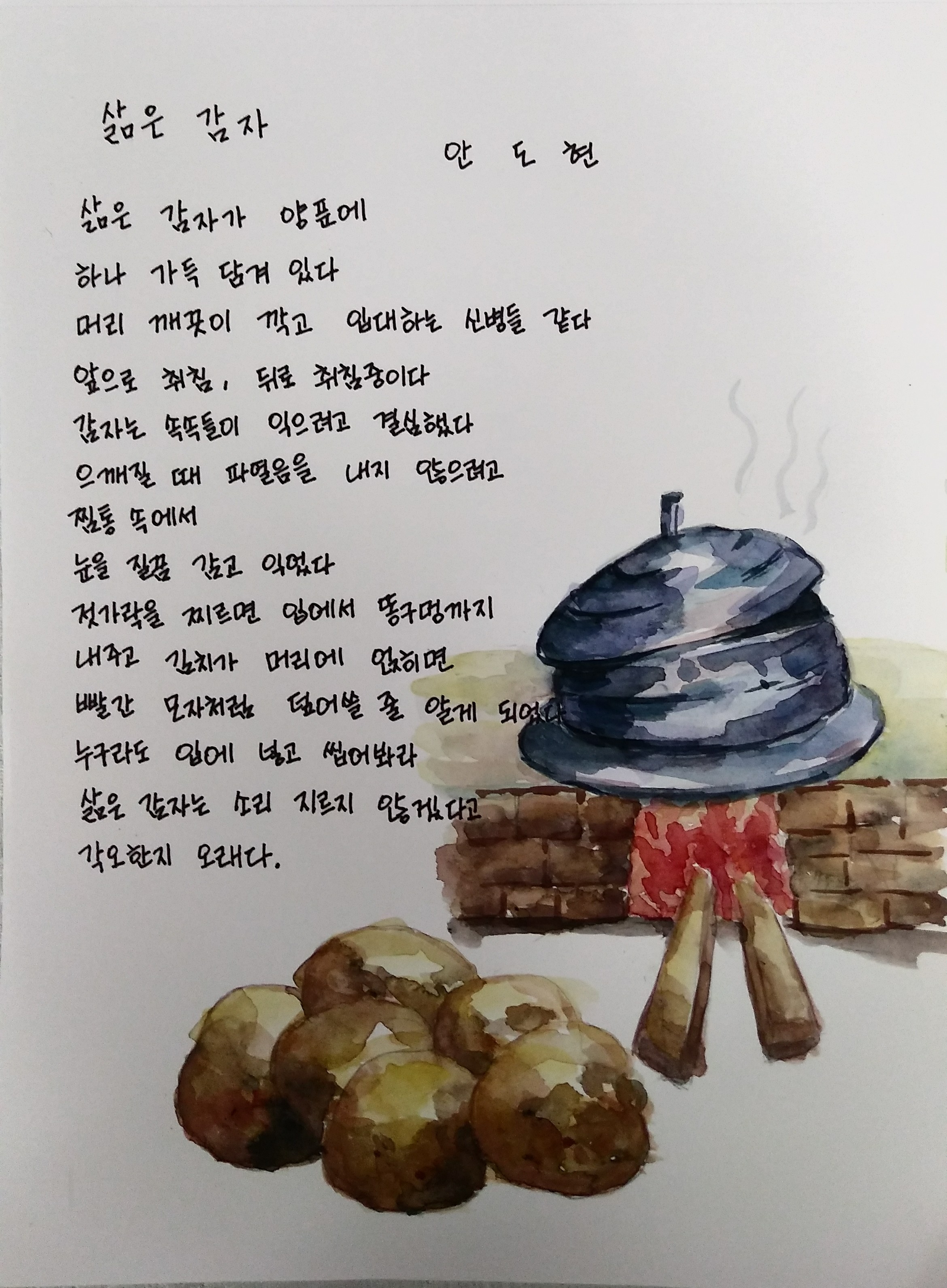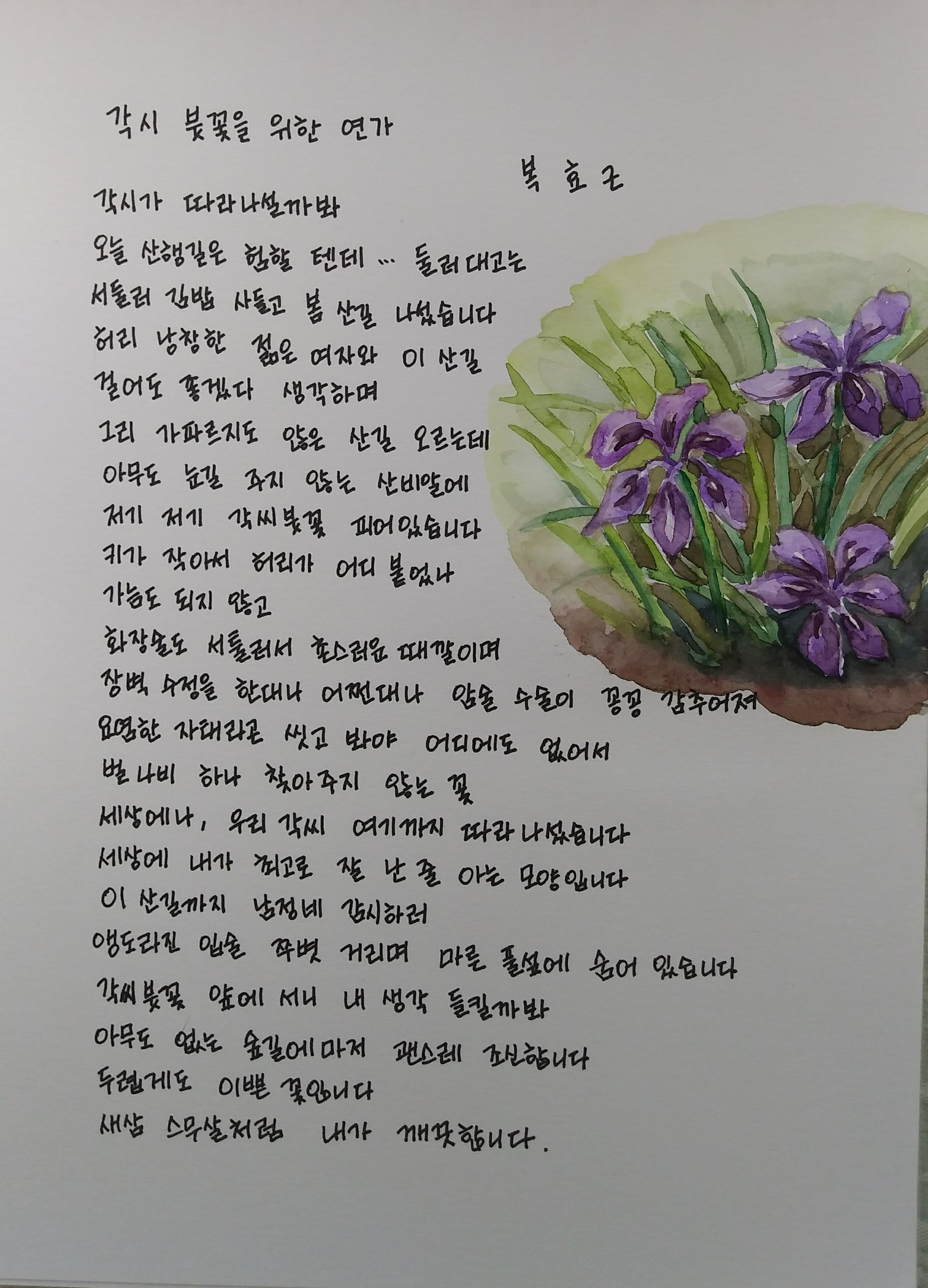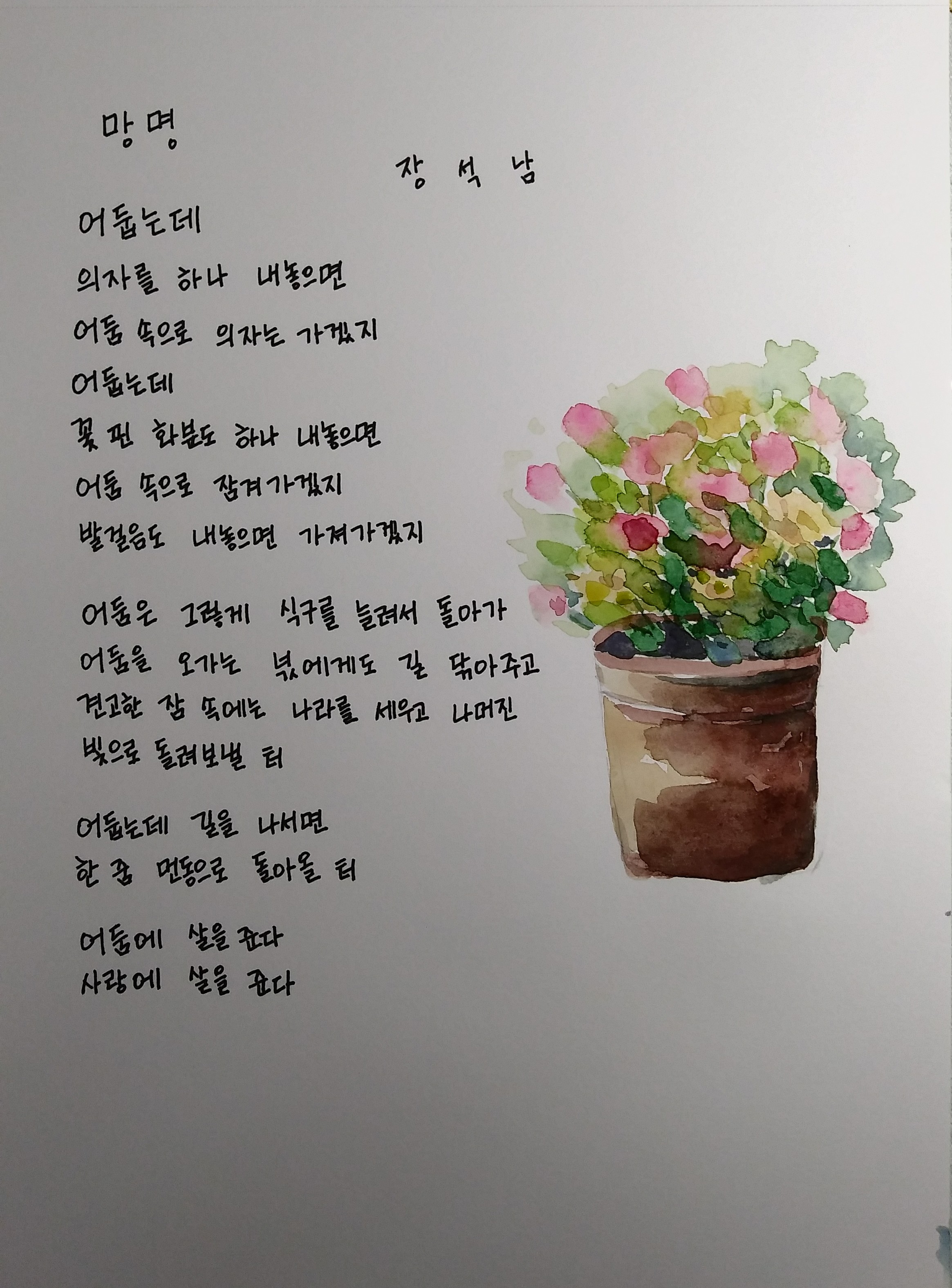촉도(蜀道) / 나 호 열 경비원 한씨가 사직서를 내고 떠났다 십 년 동안 변함없는 맛을 보여주던 낙지집 사장이 장사를 접고 떠났다 이십 년 넘게 건강을 살펴주던 창동피부비뇨기과 원장이 폐업하고 떠났다 내 눈길이 눈물에 가닿는 곳 내 손이 넝쿨손처럼 뻗다 만 그곳부터 시작되는 촉도 손때 묻은 지도책을 펼쳐놓고 낯선 지명을 소리 내어 불러보는 이 적막한 날에 정신 놓은 할머니가 한 걸음씩 밀고 가는 저 빈 유모차처럼 절벽을 미는 하루가 아득하고 어질한 하늘을 향해 내걸었던 밥줄이며 밧줄인 거미줄을 닮았다 꼬리를 자른다는 것이 퇴로를 끊어버린 촉도 거미에게 묻는다 * 시집 『촉도』 (2015)